
|
||
| ▲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김응용 삼성 감독(맨 왼쪽). | ||
심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은 감독이나 선수의 지나친 어필이다.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게 바로 판정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 선수와 감독이 어필하는 상황과 그것에 대응하는 심판들의 모습을 재연해 보면서 그들만의 고충을 알아본다.
포수 - 무언 항변 땐 “측량하냐 자 줄까?”
심판들이 주심을 볼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당연히 스트라이크와 볼에 대한 판정이다. 따라서 주심과 포수 사이에서는 경기 내내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스트라이크로 생각되는 공이 들어왔는데 볼 판정이 내려졌을 때 포수들은 판정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포수 미트를 내리지 않고 몇 초간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심판들의 방법도 가지가지. 우선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케이스. “조금 빠졌어” “미트 움직이는 거 봤다. 그만 해라”는 등 설명을 해서 포수들을 이해시킨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따끔한(?) 한마디로 포수의 기를 죽인다. “측량하냐? 자 가져다줄까?” “텐트 치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지 그러냐?”는 등.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포수가 무언의 항의를 하면 주심도 아무 말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이럴 경우 포수들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는 게 다반사다.
홍성흔(27·두산)은 “사람이 하는 판정이라 당연히 실수는 있는 법이다. 하지만 심판과 적대 관계를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심판 판정에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하면서도 심판들의 운용의 묘가 아쉬울 때가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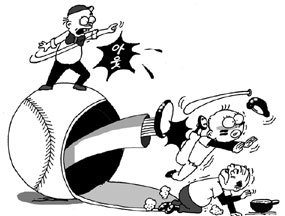
|
||
심판들이 가장 다루기 힘든 선수는 외국 용병들이다. 그중에서 로마리어와 데이비스는 ‘블랙리스트’ 0순위에 올려진 최고의 악동들. 이들은 심판의 볼 판정 하나 하나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물론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도 욕설을 퍼붓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특히 방망이나 헬멧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보이며 알아듣지 못할 심한 욕설을 퍼부을 때는 가차 없이 퇴장을 명령한다. 하지만 상벌위원회에 소집된 용병들은 그 자리에선 태도가 백팔십도로 돌변한다. 자신에게 화가 나서 욕을 한 것이지 심판에게 반항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었다며 용서를 구한다는 것.
허운 주심은 “언어가 다르니 다루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용병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욕설을 하면 그저 룰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며 악동 용병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강경진압’이라고 말했다.
감독 - 가장 곤란…분위기 반전용은 바로 퇴장
심판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는 바로 감독들의 항의다. 선수 출신인 심판들 입장에선 선배나 스승인 감독을 만날 경우 판정에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임채섭 심판원은 “시즌이 막바지로 가면서 감독들의 판정 항의가 부쩍 늘었다. 그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신(神)판이 아닌 심판의 판정이니 지나친 항의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그 고충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어려운 대응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경우는 있다. 감독들이 선수들의 액세서리나 복장, 조명, 운동장 사정 등을 이유로 심판에게 길게 항의할 때가 종종 있다. 이는 분위기 반전용으로 감독들이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것. 이럴 경우 심판들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가차 없이 퇴장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일까? 강한 어필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삼성 김응용 감독의 경우 요즘은 항의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이 탓도 있겠지만 지난 올스타전에서 심판 마스크를 써 본 김 감독이 심판들의 고충을 이해한 것이 아니냐는 후문이다.
최혁진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