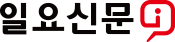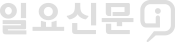-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92]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09/thm200_1712638585530192.jpg)
[일요신문]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풍수지리에 의거해 묏자리나 집터를 잡곤 했다. 지형이나 방위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인간의 길흉화복이 결정된다는 풍수설 때문이었다. 풍수가 또는 지관에게는 결코 곁에서 떼어놓을 수 없
-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91]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314/thm200_1710380193364710.jpg)
[일요신문] 단청(丹靑)은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 등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여 궁궐·사찰·사원 등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뜻한다. 단청장(丹靑匠)이란 이처럼 단청을 하는 기술
-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90] 국가무형문화재 ‘안동차전놀이’](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220/thm200_1708406910827544.jpg)
[일요신문]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온 격렬한 모의전투 놀이가 있다.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펼쳐지던 ‘안동차전놀이’가 그것이다. 차전(車戰)놀이는 마을 청장년들이 동부, 서부로 패를 갈라 ‘
-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89]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116/thm200_1705392570887966.jpg)
태평무는 바닥에 발이 붙어 있지 않는다고 표현될 정도로 발동작이 화려하다. 사진=국립무형유산원 제공[일요신문]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춤을 즐겼던 흥의 민족이다. 요즘 K컬처가 지구촌을 들썩이게 하는 것도 이러한 ‘흥
-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88] 국가무형문화재 ‘누비장’](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212/thm200_1702360902517112.jpg)
[일요신문] 누군가는 “조선시대의 패딩”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오래전 누군가는 “규방 예술의 극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던 우리 옷이 있다. 바로 전통 누비옷이다. 누비옷은 누벼서 만든 옷 즉, 누비 기법으로 만든 옷
-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87]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정악’](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09/thm200_1699506597563537.jpg)
[일요신문] 오래전 신라는 ‘피리의 나라’였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을 통해 전해지는 ‘만파식적’ 설화도 용이 보내준 대나무로 만든 영험한 피리를 소재로 한 것이었다. 신라에서 쓰이던, 세 종류의 가로로 부는
-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86] 국가무형문화재 ‘석장’](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012/thm200_1697074682383057.jpg)
[일요신문] 조선 후기의 화가 강희언이 그린 ‘돌깨기’(석공공석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는 ‘선비 화가’로 유명한 공재 윤두서의 ‘석공도’를 본떠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이 실려 있는 ‘화원별집’에는 “공재의 석공 그
-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85] 국가무형문화재 ‘금박장’](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912/thm200_1694500343605100.jpg)
[일요신문]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댕기가 /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많은 이가 익히 알고 있는 국민 가곡 ‘그네’(김말봉 시, 금수현 곡)의 노랫말 중 일부다. 그런데 그네를 타는 어느 처
-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84] 국가무형문화재 ‘칠장’](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816/thm200_1692176791820973.jpg)
[일요신문] 혹시 영어 단어 ‘japan’의 뜻을 아시는지. 미국 웹스터 사전이나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이 단어가 ‘칠’이나 ‘옻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돼 있다. 반면 우리말 ‘옻칠’을 영어(Ottchil)로
-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83] 국가무형문화재 ‘학연화대합설무’](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722/thm200_1690006948193859.jpg)
[일요신문] 지난해 이맘때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아주 특별한 춤이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립무형유산원이 현지 국립고려극장과 고려인협회 소속 무용단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무용의 하나인 ‘학연화대합설무’를 교육하고
-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82]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613/thm200_1686621323822343.jpg)
[일요신문] 과거 냉방기기가 흔치 않던 시절에는 여름철에 부채를 선물하는 것이 일상사 중 하나였다. 마치 요즘 ‘손풍기’를 들고 다니듯, 손에 부채를 쥐고 흔들며 땀을 식히는 이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
![꼭 지켜야 할 우리 유산 [81] 국가무형문화재 ‘궁중채화’](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510/thm200_1683682994281684.jpg)
[일요신문]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는 과거 급제자들이 북주감투에 어사화를 꽂고 금의환향하는 모습이다. 어사화란 임금이 하사하던 종이꽃을 뜻하는데, 특히 문과 급제자에게는 비단으로 만든 꽃인 ‘금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