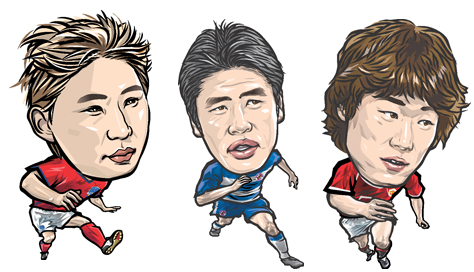
|
||
| ▲ 캐리커처=장영석 기자 zzang@ilyo.co.kr | ||
사실 이천수는 이달 초부터 뭔가 조짐을 보였다. 영국 런던에서 그리스와의 A매치를 준비하던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훈련을 전혀 안했다” “(훈련) 하면 뭐하나 다 소용없다” “올 여름에도 유럽에 못 나가면 은퇴하겠다”는 등의 ‘메가톤급 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기사로 쓰면 파문이 일겠다 싶어 기자들이 알아서 쉬쉬했을 정도로 그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이천수는 이번에 너무 가볍게 입을 열었다. 아무리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천수의 이번 발언을 보며 “역시 이천수답다”고 무릎을 치는 사람들도 있다. 마음에도 없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늘어놓는 선수들에 비해 속에 있는 말을 ‘날 것’ 그대로 내보이는 그가 왠지 인간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이천수를 취재한 기자도 어느 정도 이 의견에 동조한다. 이천수의 이번 발언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속마음을 숨긴 채 가식적인 말을 하는 선수들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이천수가 ‘인터뷰이(interviewee)’로서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이천수 외의 다른 축구 스타들은 인터뷰할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스타플레이어들의 말 솜씨와 그 속에 숨은 매력을 알아본다.
걸어다니는 기삿거리, 이천수
2006년 독일월드컵 스위스전이 끝났을 때 딱 세 명의 선수가 믹스트존에서 제대로 인터뷰를 했다. 프리미어리거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홋스퍼)와 이천수가 그 주인공이었다. 대부분의 선수는 스위스전 완패와 16강 좌절이란 충격에 휘청거린 채 말없이 믹스트존을 빠져나갔다.
박지성과 이영표가 영어와 한국어를 써가며 믹스트존에서 수차례나 똑같은 말을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공식적인 인터뷰를 당연시하는 프리미어십에서 선수 생활을 한 이들에게 국제축구연맹(FIFA)이 권고한 믹스트존 인터뷰는 ‘전공 필수’였기 때문이다.
박지성과 이영표가 프로 선수로서 인터뷰에 응했다면 이천수는 할 말은 하는 성격 때문에 인터뷰를 했다. 박지성과 이영표가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패배의 심정을 전했을 때 이천수는 아픈 건 아프다고 울부짖었다. “이천수라는 사람의 운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천수는 이번 그리스전을 마친 뒤에도 특유의 직설화법을 썼다. 이천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말에 “조그만 선수가 열심히 뛰니까 관중이 예쁘게 봐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프리미어리그 진출 의지를 묻자 “올 여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오겠다”고 답했다. 런던에서 열린 그리스전 골로 프리미어십 진출이 가까워 진 게 아니냐는 덕담에는 “이번 골로 잉글랜드행이 가까워진 것 같다”며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쯤 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그대로 기삿거리인 셈이다.
너무나 인간적인 그, 설기현
설기현(레딩FC)은 이천수처럼 톡톡 튀게 말하지 못한다. 이영표같이 현학적인 말을 구사하지도 못한다. 게다가 처음 보는 기자들한테는 낯도 가린다. 하지만 그는 ‘진정성’을 무기로 그를 인터뷰하는 기자들을 반하게 한다.
설기현은 울버햄프턴에서 뛰던 시절 “TV에서 프리미어십 경기만 중계해주지 챔피언십 경기는 안 해준다”며 “경기도 안 보고서 ‘설기현 악!’ 같은 기사 쓰는 분들 보면 정말 화가 난다”고 투덜거렸다.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낸 그는 프리미어십 레딩에 입단한 뒤 “사람들이 이제야 내 경기를 TV로 볼 수 있게 됐다”며 소년처럼 웃었다.
설기현은 요즘 부진에 빠졌다. 시즌 초반의 상승세를 계속 잇지 못하고 벤치 멤버로 전락했다. 다른 선수라면 이럴 때 인터뷰를 꺼린다. 설령 인터뷰를 한다 해도 단답형 답변으로 끝내거나 대충 얼버무린다.

|
||
| ▲ 캐리커처=장영석 기자 zzang@ilyo.co.kr | ||
설기현의 인간미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다. 기자는 2005년 여름 설기현이 살던 울버햄프턴에 간 적이 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설기현은 “칼링컵 경기를 뛰니 칼링 맥주를 주더라”며 맥주 한 박스를 내놓았다. 기자를 기자로 대하지 않고 인간으로 대하는 그의 소탈한 면을 보여준 일화다.
선수야 돌부처야, 박지성
박지성은 인터뷰를 좋아하지 않는다. 차두리(마인츠) 정도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인터뷰를 피하려고 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다. 하긴 ‘돌부처’라고 불리는 박지성에게 이천수의 입담을 바라는 것은 연못에 가서 고래를 찾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찰턴 애슬레틱의 프리미어십 경기가 열렸던 지난 10일(영국시간)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현장에 있던 필자는 박지성이 골을 넣자 쾌재를 불렀다. “골까지 넣었는데 오늘은 (인터뷰를) 길게 해주겠지.”
하지만 역시 박지성이었다. 결승골로 시즌 2호 골을 기록했는데도 도대체 그의 얼굴에는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흥분한 목소리로 감격해할 법도 했지만 그는 싱겁게 인터뷰를 마쳤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절친한 친구 에브라의 도움을 받아 골을 넣었는데 경기 뒤에 무슨 얘기 나눴어요?”(기자) “얘기 안했는데요.”(박지성) “자신의 골로 팀이 이겼는데 팀 분위기는 어때요?”(기자) “무덤덤한데요”(박지성).
최근 박지성과 이메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질문은 두 줄이었는데 답변은 대개 ‘그렇습니다’나 ‘아닙니다’가 답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지성이 너무 재미없다는 지적에 그의 아버지 박성종 씨는 웃으며 말한다.
“그런 성격이니까 외국 나와서 딴 생각 안하고 축구만 하죠.”
필드의 ‘음유시인’, 이영표
한일월드컵 때의 일이다. 포르투갈을 꺾은 한국은 이탈리아와의 대회 16강전 준비를 위해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훈련을 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다. “이탈리아전을 앞둔 소감 좀 얘기해주시죠.” 이영표가 대답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습니다.” 웬만한 선수는 흉내도 못내는 전형적인 이영표식 인터뷰였다.
이영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보면 기사를 읽는다는 기분이 든다. 구어체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얘기. “한국이 아시아 축구의 강자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동국 선수는 프리미어십에서 자신의 재능을 입증할 만한 자질을 갖춘 선수다”.
능수능란한 인터뷰 솜씨 못지않게 이영표는 기자 다루는 데도 ‘도사’다. 심각한 인터뷰에 앞서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슬쩍 만지면서 “이런 거는 얼마나 해요”라고 묻거나 이것저것 말하는 설기현을 보며 “이런 거 해봐야. 방송에서 다 잘려(편집돼)”라며 능청을 떤다.
이영표의 인터뷰 실력에 혀를 내두르는 것은 한국 기자뿐만이 아니다. 프랑스의 스포츠전문지 <레퀴프>의 크리스토프 라르셔 기자는 독일월드컵 때 이영표를 인터뷰한 뒤 “한국에도 저렇게 말을 잘하는(그것도 영어로) 선수가 있느냐”며 놀라워했다.
과묵한 ‘라이언킹’, 이동국
‘군대를 갔다 와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다.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에다 수줍기까지 한 이동국(미들즈브러). 그는 과거에 그다지 인터뷰를 잘 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개구리 마크(예비역의 상징)’를 단 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제법 말도 많아졌고 능청도 떨기 시작했다. 미들즈브러 입단식을 위해 출국하는 날 공항 기자회견 중에 앞에 앉아 있는 수많은 기자들을 향해 이동국은 “앞으로 제 기사에 더 이상 ‘게으른 천재’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미있는 부탁을 건넸을 정도다.
그런데 프리미어십에 진출한 뒤 이동국이 다시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미들즈브러 훈련장을 찾은 한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프리미어십에 적응하기 전까지 섣부른 행동을 안 하겠다는 듯 정중히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런 이동국을 보며 미들즈브러의 언론 담당관인 데이브 앨런은 “동국은 모든 것을 필드 위에서 보여주려는 각오”라고 귀띔했다.
전광열 스포츠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