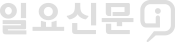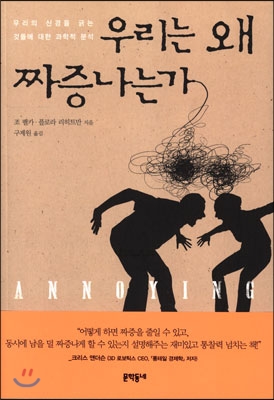
[일요신문] 짜증나는 소리, 짜증나는 냄새, 짜증나는 운전자, 짜증나는 친구, 짜증나는 배우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상황에 처하지만 누구도 이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왜 짜증이 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짜증을 느끼는지 자료나 측정치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없다.
우리는 습관적 혹은 반사적으로 짜증을 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왜 짜증나는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이에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NPR)의 과학전문기자 조 팰카와 플로라 리히트만은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섰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화나 사건을 예로 들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짜증스럽지 않게’ 짜증을 소개한다.
<우리는 왜 짜증나는가>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짜증 유발 요소로 신체적인 불쾌감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들려오는 휴대전화 대화, 정신 사납게 울려대는 사이렌,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강렬한 악취, 주위를 산만하게 날아다니는 파리 등 갖가지 요소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오감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같은 감각이 자극을 받는 경우에도 짜증을 내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통화의 경우 단순히 큰 소리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패턴이 일정하지만 언제 끝날지도 불확실하고,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반쪽짜리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체제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통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결국 짜증스러워진다.
일반적으로 감정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자들은 감정 또한 개인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속성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서양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될 때 짜증나지만 동양 사회에서는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거나 공공장소에서 화장을 하는 등 개인이 집단에서 두드러지게끔 행동할 때 짜증이 유발된다. 이처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짜증은 일종의 ‘사회적 알레르기’다.
사회적 알레르기는 특히 다른 타인에 비해 방어막이 얇은 배우자 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쩝쩝대며 음식을 먹거나 다 쓴 휴지를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는 등의 사회적 알레르기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감정적 폭발이 일어난다. 배우자에게 짜증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행동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당연히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 이럴 경우 배우자의 습관을 받아들이거나 별난 점을 재평가하는 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뭔가를 노력할 때 짜증이 줄어들게 마련이라고 한다.
이 책은 이런 일상적 불쾌와 짜증에 대해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과학적 설명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섬세함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해준다. 조 팰카․플로라 리히트만 공저. 구계원 옮김. 문학동네. 정가 1만 5000원. 연규범 기자 ygb@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