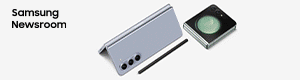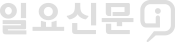지난 3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서울모터쇼’ 현장. 사진=박정훈 기자
지난 3월 세계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유럽 브랜드인 오펠을 PSA그룹에 매각했다. 소형 스포츠카의 명가 로터스는 중국 지리자동차에 팔렸고,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폴크스바겐은 FCA(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인수를 넘보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인수·합병(M&A)이 난무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이 부진하고 투자 과잉이라는 뜻이다.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속에 저배기량 고출력 차량, 디젤 엔진의 대두, 차량의 대형화·고급화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익률은 쪼그라들었다. 경쟁에서 낙오한 회사들이 속속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벌어지는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규모의 경쟁은 자동차 회사들의 피를 말린다.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 마티아스 뮐러가 피아트 인수 의향을 흘린 것은 PSA가 오펠을 인수한 직후다. 폴크스바겐은 유럽 판매량 1위지만 PSA로부터 왕좌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디젤게이트로 파문을 일으킨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FCA는 지프 브랜드 등으로 미국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 북미 시장에 약한 폴크스바겐으로서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좋다.
폴크스바겐은 FCA 인수가 여의치 않으면 포드자동차 인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포드는 대개의 미국 자동차 회사들처럼 최근 판매량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인수할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 파워보다도 생산량 증대가 목표다. 연간 1500만 대를 생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지난해 판매량은 1000만 대. M&A를 통해 50% 이상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직후에는 승자독식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 다른 회사의 기어비나 엔진·미션세팅 기술 등을 흡수함으로써 품질 향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시너지 효과는 르노와 닛산 간에 연합전선에서 볼 수 있다. 르노는 닛산의 지분 35%를 보유한 양대 주주다. 르노는 프랑스 정부가 보유한 회사로 닛산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인수했다. 대신 느슨한 형태의 동맹과 기술 협력을 강화했다. 경·소형차 라인업 중심인 르노가 자동차 프레임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세계적 자동차 회사로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난 3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서울모터쇼’ 현대자동차 부스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테슬라나 구글·애플·우버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도 자동차 산업의 합종연횡을 부채질 하고 있다. 기술 대기업의 등장은 기존 자동차 기업들을 뭉치게 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늘릴 필요성도 커졌다.
다만 덩치만 키운다고 경쟁에서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내부 연소 엔진이 지난 100년간 주도해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및 전자부품이 기계 부품을 대체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하고 있다. 단지 자동차 판매에서 자동차에서 엔터테인먼트 등을 즐기는 ‘자동차 서비스’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분야에 강한 애플이나 구글 등의 자동차 회사 인수가 변화의 소용돌이를 촉발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IHS마켓의 팀 어커트 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지는 대형 M&A에 대해 “수익성 제고 방안 없는 단순 메가 M&A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결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물론 이런 변화에 현대차그룹도 자유롭지 못하다. 전기·자율주행 분야에서 현대·기아차는 한 발 뒤처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에서 유럽과 일본에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산업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런 평가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율주행과 연료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독일·일본 동맹 간에 기술 표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대·기아차도 이들 기술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미래 자동차 기술에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서광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