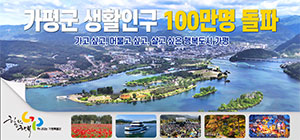윤옥주 시인.
그 속에서 어린 시절의 뒤란을 찾아 간 시인을 따라 ‘뒤란을 따라 걷기’를 동행해 본다. 시인은 “캄캄한 피들이 저무는 그런 뒤란이 내게는 있다”는 회상을 통해 지나간 어머니의 시간들을 불러낸다.
빈집의 뒤란에 홀로 남아 그늘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손수레는 어머니의 분신 같은 존재이다. 평생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만 하며 살다가 이제는 다 늙고 지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 우리는 여기에서 손수레와 병치되고 있는 어머니라는 대상이 바로 추운 겨울 매서운 눈보라와 싸워가며 여린 꽃잎들을 보호해주던 “아린”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현재 어머니가 겪고 있는 병을 지켜보아야 하는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시의 행간에서 읽힌다. 그러나 오늘도 어머니는 죽음 쪽으로 한 걸음 더 기울어지고,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은 고독과 슬픔을 낳는다.
‘다시 기타가 있는 방’은 “통증 하나가 관통하고 빠져나간 기타가 있는 방”을 묘사하고 있다. 방 한 켠에 놓여 있는 낡고 먼지가 묻은 기타를 통해 잃어버린 꿈들이 다시 불려나온다.
시인은 그늘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내 몸에는 늘 새로운 가지가 자란다”는 문장 속에서 늘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일상을 엿볼 수 있다. 봄이 오고 기타의 입구에 목련이 피듯 시인은 삶에서 다시 환한 꽃들이 피어나기를 희망한다. 아마도 내일이라는 꿈이 있기에, 오늘의 고통은 참고 견딜만한지도 모르겠다.
“끝없는 새로운 시작의 불확실성”(블랑쇼)을 긍정하는 시인에게, 시란 먼 곳까지 걸어가고, 멈춰 서서 바라보며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생활의 모든 순간이다. 세상의 모든 당신들에게 입을 맞추고 여백을 만들어 내는 집중과 황홀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인간은 자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선다. 떠나가고 머무는 인생의 길 위에서 어둠 속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눈이 별처럼 환하게 빛난다.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린 빛나는 발자국들...
윤옥주 시인은1961년 정읍출생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졸업했다. 2006년 ‘한국수필’을 통해 등단했으며, 2012년 ‘발견’으로 등단해 제7회 발견작품상 수상했다. 시집으로는 ‘젖은 맨발이 있는 밤’이 있다.
다음은 윤옥주 시인의 ‘뒤란을 따라 걷기’ 발췌.
낡은 손수레가 놓여있는 뒤란
그늘을 품었던 관절들이 어긋나 있는 풍경
허공에 집을 짓다만 거미와
장독대 위 빈 항아리와 함께
하루하루 저물어가는
눈동자
기억이 빠져나가듯 탱탱하던 바퀴도
호흡을 멈추고
바람이 다 빠져나간 심해에는
빛이 들지 않는다
캄캄한 피들이 저무는 그런 뒤란이 내게는 있다
비가 내리던 뒤란은 여전히 손수레에 대한 이야기
일렁이는 빛이 수레에 고인다
서로의 품에 의지하던 말 어머니와 손수레
다음은 윤옥주 시인의 ‘다시 기타가 있는 방’ 발췌.
어떤 통증 하나가 관통하고 빠져나간
기타가 있는 방
기타의 입구에 목련이 피어있다
속울음 가득한 먼지를 이고
기타와 목련의 한 소절이 늙어간다
기타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되고
내 몸에는 늘 새로운 가지가 자란다
만져본 적 없는 시간들이
손끝에서 저문다
다시 기타가 있는 방
여섯 개의 방을 차례대로 튕겨본다
조율되지 않는 시간을 불러내듯 조인다
한 그루의 그늘이 깊어간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uga3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