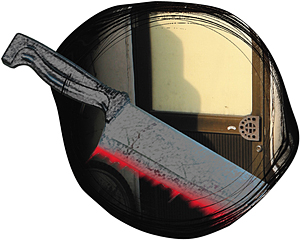
|
||
지난 2006년 5월 초의 늦은 밤. 인천 부평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는 한 중년 남자가 경찰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부평에 거주하는 A 씨였는데 술을 어찌나 많이 마셨는지 몸을 거의 가누지 못했다. 늦은 밤에 느닷없이 만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쳐들어와서 횡설수설대는 남자.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었다. 안 그래도 밤마다 취객들로 인해 홍역을 치르는 경찰들에게 A 씨는 결코 반가울 리 없는 불청객이었다.
“어딜 갔다는 거요? 또 없어졌다는 형님은 누구고?”
“내가 출소해서 형님 집에 찾아갔는데 우리 형님이랑 같이 살고 있던 허 씨 형님이 없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구요?”
“그게…. 내가 출소하자마자 갔으니까 2004년 9월이죠.”
2년여 전의 일을 꺼내며 얘기 보따리를 풀려는 남자. 하지만 경찰은 이런 남자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어서 잘 달래 돌려보내려고 했다.
이 양반아, 술을 자셨으면 곱게 들어갈 일이지. 그 형님을 찾아달라는 거요, 뭐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난 교도소에 있었다니까요.”
“그거고 아니고 간에 업무에 방해되니 내일 멀쩡한 정신으로 다시 오쇼!”
“아. 글쎄. 저는 안 죽였다니까요. 우리 형님이 죽였어요. 우리 형님이 그 형을 죽였단 말입니다!”
순간 파출소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이 감돌았다.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들은 A 씨의 입에서 터져나온 ‘폭탄’에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술김에 친형의 살인행각을 신고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이번에 인천부평경찰서 강력3팀 김민우 형사가 전하는 사건은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난 뒤 친동생의 신고로 밝혀진 엽기적인 사건이다.
우선 당시 상황에 대한 김 형사의 얘기를 들어보자.
“파출소로부터 살인사건접수가 됐다. 신고자가 많이 취한 상태이긴 했으나 말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고 하더라. 들어보니 아무리 취했기로서니 멀쩡한 친형을 살인범으로 허위신고를 할 순 없겠다 싶었다.”
수사팀은 정확한 사건파악을 위해 즉시 A 씨를 불러들였다. A 씨는 자신의 친형인 윤달식 씨(가명·62)의 살인행각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요약하자면 윤 씨가 같이 살던 허석구 씨(가명·64)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냈다는 차마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더구나 A 씨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 2004년이었다.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진실’을 알리겠다고 경찰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모른 척 할수도 있는 친동생이 나서서 밝혀야만 하는 사연은 무엇일까. 과연 A 씨의 말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A 씨에게 다른 속셈은 없는 것일까. A 씨와 마주한 수사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지만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은 김 형사의 얘기.
“윤 씨와 허 씨는 2004년 4월경에 알게 된 사이라고 했다. 주변의 말에 따르면 윤 씨는 어릴 때부터 부평에서 자라온 토박이로 본래 집안 형편은 꽤 괜찮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무슨 사정에서였는지 윤 씨는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게 됐고 그의 가족들은 윤 씨와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동생 A 씨만 남겨두고 모두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했다. 당시 윤 씨는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상태로 이렇다 할 직업은커녕 마땅히 거처할 곳조차 없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출소 후 도움을 청할 가족이 없었던 윤 씨는 떠돌이 신세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허석구 씨를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허 씨는 윤 씨와 마찬가지로 부평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인물이었다. 나이도 비슷한 데다 형편도 비슷했던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당시 부평에 있는 폐가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허 씨는 윤 씨의 형편을 딱하게 여기고 “같이 살자”고 제안, 그해 5월 중순경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된다.
피 한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형님’ ‘동생’하며 마치 친형제처럼 잘 지냈다. 특히 평소 술을 무척 즐겼던 이들은 이 사건의 제보자인 윤 씨의 친동생 A씨까지 집으로 불러들여 술자리를 갖곤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은 김 형사의 얘기.
“윤달식의 동생 A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혐의로 구속되고 만다. A 씨는 몇 달을 복역한 후 2004년 9월에 출소했고 얼마 후 형이 사는 집에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수감되기 전까지만 해도 형과 함께 살고 있던 ‘집주인’ 허 씨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다. ‘잠시 어디 갔겠거니’하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허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업도 없고 마땅히 머무를 곳도 없어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머물고 있던 허 씨가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싶어 찾아 보았지만 허 씨의 행방은 묘연했다고 한다.”

|
||
“알고보니 허 씨가 수감 중이라는 소문도 윤 씨가 퍼뜨린 것이었다. 이쯤되니 A 씨로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갈 곳도 없는 양반이 본래 자기가 살던 집을 놔두고 사라질 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을 테고, 특히 허 씨와 같이 살던 형이 그의 행방을 모른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더구나 윤 씨는 허 씨의 행방을 궁금해하거나 그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급기야 A 씨는 형을 붙들고 허 씨의 행방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어느날 술을 진탕 마신 윤 씨에게서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됐다고 한다. ‘내가 허 씨를 죽였다’는 얘기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윤 씨가 허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낸 뒤 유기했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정밀수사에 들어갔다. 가장 시급한 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체를 찾는 일이었다. 윤 씨가 허 씨와 함께 지내던 집안 곳곳을 수색하던 수사팀은 집안 재래식 화장실에서 토막난 사람의 몸통 부분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사체 일부가 발견됨으로써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이어지는 김 형사의 얘기.
“사체 일부를 찾은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사건발생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미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탓에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당시 윤 씨는 동생 A 씨가 신고하기 약 석 달 전인 그해 2월에 절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우리는 허 씨가 정부로부터 매달 20만~30만 원가량의 생활보조금을 받아온 기초수급대상자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확인결과 허 씨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20일마다 정확하게 돈을 찾아가곤 했는데 마지막으로 돈을 찾아간 날짜가 2004년 7월 20일이었다. 허 씨가 살아 있었다면 8월 20일에도 돈을 찾아갔어야 할텐데 7월 20일을 끝으로 돈을 찾은 흔적이 없더라. 따라서 우리는 허 씨가 최종적으로 돈을 찾은 7월 20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증거를 확보한 수사팀은 수감 중인 윤 씨를 상대로 허 씨 살인혐의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했고 얼마 후 그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기에 이른다.
윤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의 사이는 여전히 이상없었다. 그러나 허 씨의 나쁜 손버릇 때문에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자신이 잠들면 허 씨가 몰래 자신의 돈을 훔쳐가곤 했다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는 돈 때문에 잔뜩 벼르고 있던 윤 씨는 어느날 단단히 혼내 줄 생각으로 머리맡에 칼을 놔두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사건 당일 새벽 사그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뜬 윤 씨는 자신의 방에 살금살금 들어와서 돈을 가져가려는 허 씨를 발견하게 된다. 허 씨의 행동에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한 윤 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머리 맡에 둔 흉기를 휘둘러 허 씨를 살해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2년여 동안 묻혀져 있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조사결과 윤 씨는 허 씨를 살해한 뒤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2년 가까이 수시로 조촐한 음식상을 차려놓고 제사까지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렇게 차분하게 범행의 전모를 털어났던 윤 씨는 ‘처벌’을 두려워했는지 얼마 후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며 수사팀을 농락했다. 다음은 김 형사의 얘기.
“윤 씨는 허 씨가 자기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괘씸하고 화가 나서 죽였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얼마 후 ‘진짜 내가 죽인 게 아니라 꿈 꾼 얘기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더라. 그의 변명은 갈수록 가관이었다. 허 씨가 중풍을 앓고 있었는데 중풍치료에 사람 골을 고아먹으면 낫는다는 얘기를 들은 허 씨가 인근 공동묘지에서 사체를 하나 가져왔고 그것을 본 윤 씨가 끔찍하다며 내다버리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안 듣기에 결국 자신이 ‘처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수사팀이 발견한 사체는 허 씨의 사체가 아닌 허 씨가 자신의 지병치료를 위해 갖다 놓았던 타인의 사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윤 씨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사팀에게는 사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과수의 DNA검사 결과 토막난 몸통은 허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거둬준 허 씨를 사소한 이유로 죽여놓고도 막판에 다시 죄를 부인하는 윤 씨의 모습에 수사팀은 씁쓸해 했다. 절도 혐의로 수감 중이던 윤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구치소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