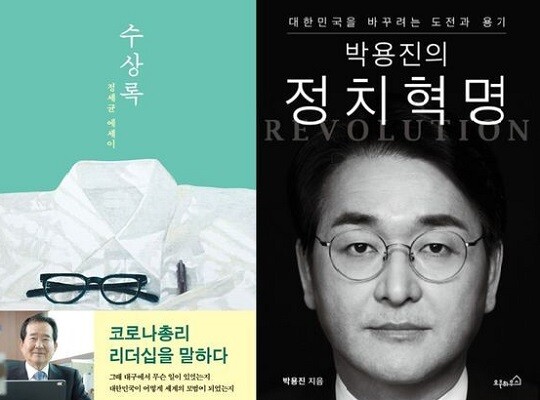
대선주자들에게 책은 후원금을 걷고 세를 규합하는 등 흥행을 일으키는 주요 수단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의깃발_감상문_릴레이’ 운동으로 자신의 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출마 선언 이틀 만에 후원금 5억 원을 걷었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신의 입지를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 김두관 의원은 광주와 부산 등 전국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마지막 출판기념회엔 노무현 전 대통령 친누나인 노영옥 씨가 참석해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다시 각인시키기도 했다.
한 대선주자 보좌진은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점이 있는 건 맞다”며 “책이라는 매개로 행사를 열 수도 있고, 후보의 정치 철학이나 정책을 지지자들에게 각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들이 책을 낼 때 보좌진이 가장 애를 먹는 건 대필 작가 섭외다. 정치인이 선거철을 앞두고 직접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집필을 대필 작가에게 맡기기나 기자나 시사평론가가 해당 정치인의 평전을 쓴다.
한 예로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자신과 관련한 책이 최근 4개월 동안 5권(‘윤석열의 시간’, ‘구수한 윤석열’, ‘윤석열의 진심’, ‘윤석열의 운명’, ‘별의 순간은 오는가’)이 나왔다. 모두 제3자가 윤 전 총장 이야기를 듣거나 인물을 분석해 쓴 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록 사진집 ‘지금은 이재명’은 강영호 작가가 이 지사의 모습을 담아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낙연의 약속’ 또한 기자 출신 저자가 글을 정리했다.

앞서 보좌관은 “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후보가 원고를 직접 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실 대필 작가 찾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인이 책을 의뢰하면 출판사가 직접 대필 작가를 섭외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이 지원금 명목으로 출판사에 주는 돈은 많게는 3000만 원가량이라고 한다. 이 돈은 대부분 대필 작가를 섭외하는 데 쓰이는데, 대필 작가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한 출판사 대표는 “대필 작가 찾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정치인들은 유명한 작가를 대필 작가로 섭외하길 원하지만 대부분 꺼려한다”며 “특정 정치인 라인으로 분류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건 대필 작가로 못 박히면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의 책을 시사평론가나 기자들이 쓰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출판사들이 정치인 책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지율에 따라 책이 잘 팔릴 수도 있지만 아예 재고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또 다른 출판사 대표는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의 책은 많이 나가기도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는 60만~70만 부가 팔렸다. 그분 경우엔 책이 호응을 얻으면서 정계 복귀 발판이 되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잘 팔리는 건 극히 일부고, 대부분 1쇄를 넘기기 어렵다. 출판사 입장에선 모 아니면 도인 셈”이라고 전했다.
정치인의 색이 덧붙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책 출판을 꺼리기도 한다.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해도 ‘메이저 출판사’와 계약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출판된 대선주자 책 가운데 유명 출판사가 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인들은 출판사에 책을 내줄 경우 암묵적으로 부수 구매를 보장하는 ‘사재기’를 약속을 하거나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기도 한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이던 2008년 당시 정치후원금으로 자신의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를 300만 원어치 구입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출판사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정치인 책을 내기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뢰’와 ‘진정성’을 꼽았다. 앞서의 출판사 대표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책에 담을 메시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대부분 정치인이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 내는 걸 우습게 아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출판사 대표는 “최근엔 대담집이라고 밝히거나 엮은이가 따로 있다고 명시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며 “저자가 정치인 한 명만 돼 있는 경우는 그 출판사의 코칭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 정치인이 원고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대금을 차후에 치르는 업계 관례 탓에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출판사 대표는 “대통령 후보쯤 되면 다르긴 하지만, 지방선거 땐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온다”며 “책을 얼마만큼 사겠다거나, 홍보를 어떻게 해주겠다느니 약속을 많이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며 “업계에선 정치인 가운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인식이 크다. 책에 들어갈 내용이나 홍보 방식을 출판사가 정해둔 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인 책은 내지 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