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E&S는 SK그룹의 가스·전력 계열사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1조 2489억 원과 1조 4191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한 덕분이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LNG발전은 향후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SK E&S는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솔루션 △친환경 LNG 등 4대 핵심사업을 구축해 차별화된 ‘그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SK E&S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사업은 저탄소 LNG와 블루수소다. 본업인 LNG 발전사업을 폐기할 수는 없는 까닭에 CCS 상업화 쪽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셈이다. CCS란 LNG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해저에 위치한 폐유전에 저장해 발전 과정에서 공기 중에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SK E&S는 2025년 상업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CCS를 활용해 2025년부터는 연 25만 톤(t) 규모의 블루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블루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린수소와는 달리 그레이수소(천연가스 등을 분해해 얻는 수소)와 비슷한 공정을 거치지만 CCS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줄인 수소를 뜻한다.
지난 7월 26일 추형욱 SK E&S 사장은 크리스 보엔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LNG 개발과 블루수소 생산에 대해 논의했다. CCS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LNG를 생산하고, 해마다 약 130만 톤(t)을 국내로 들여와 블루수소 생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생산 과정과 국내에서 블루수소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량을 포집한 후 동티모르에 있는 바유운단 폐가스전에 저장한다는 계획이다.
CCS의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CF100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CF100은 재생에너지 외에 수소나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로 전력을 100% 공급하는 개념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포함한 점도 SK E&S의 입장에서는 호재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CCS기술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0년째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데 마땅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실제 개발을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에너지는 저렴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아무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 해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역시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이 배출된 탄소의 80%까지 포집을 해서 저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21년 자료를 보면 24%까지밖에 포집을 못했다”며 “폐유전에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으로 누설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상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최근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걸로 안다. 북미 등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원과 사업 기회가 많은 까닭에 국내에서도 주요 에너지 대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업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CCS와 블루수소 모두 RE100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순진 환경·에너지 정책학 박사는 “세계 전체가 그린수소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소를 이용하는 건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LNG를 개질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CCS는 탄소가 포집 및 저장 과정에서 누설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RE100에 포함되기 어렵다”며 “RE100이 CF100보다 인지도와 영향력이 훨씬 높은데다 이미 국제 무역을 위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어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을 외면하면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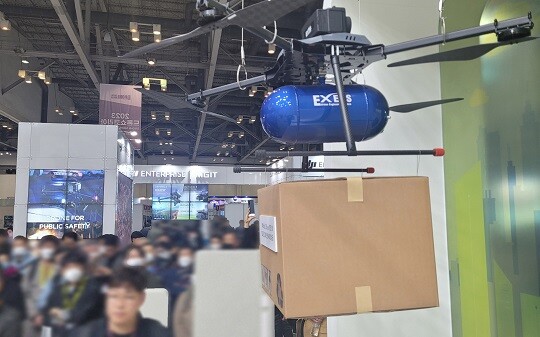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집중하기에는 국내 환경도 녹록지 않다. 일단 국토가 좁아 발전소 부지를 찾기 쉽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의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받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보상비를 요구받고 풍력발전 역시 어민들이 조업 구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해 비용적으로도 난감할 때가 많다”며 “사업부서에서 부지 인허가 문제로 이슈가 많아 항상 골머리를 앓는다”고 말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9개 부처에서 25개의 법령상 인·허가가 절차가 필요한 까닭에 보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석광훈 위원은 “해외의 경우 정부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부지를 직접 조성해주기 때문에 부지 인허가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적고 최근엔 이런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유럽연합에서는 지난해 재생에너지촉진지구를 조성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9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내주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도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는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 의무공급 비율도 2026년 기준 25% 수준에서 15%로 대폭 줄였다. 박종운 교수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며 나홀로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있는 까닭에 투자가 주춤하고 발전 비용을 더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태양광 비리 등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흠 잡힐까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적자로 인해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있는 점도 발전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다른 관계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을 들락날락할 때 일정한 출력이 가능하도록 평탄화하려면 그리드 기술을 바꿔야 하는데 비용이 적잖게 든다. 전력망 제어가 안 되니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으면 오히려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산업육성 의지가 없는 데다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을 붙잡고 있는 까닭에 송전망이나 에너지 저장장치 투자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널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투자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발전 사업자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 E&S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에도 시동을 걸며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18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오스 접경지역에 756M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소 건설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CCS와 관해서는, 화석연료를 지금 당장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상업화만 된다면 큰 혁신이라 보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