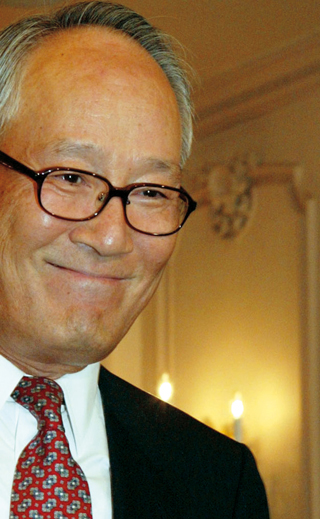
|
||
| ▲ 이준용 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이해욱 부사장(얼굴 사진)으로의 경영권 승계 급물살 소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 ||
이준용 명예회장이 2선으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던 것. 이를 두고 당시 그룹 안팎에서는 이해욱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후 외부행사에만 간간이 모습을 드러내던 이 명예회장은 8개월 만에 ‘컴백’했다. 2007년 11월 여천NCC에 공동 투자한 한화그룹과 분쟁이 일어나자 ‘소방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 명예회장은 김승연 한화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들고 나와 재계와 언론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정중동 행보를 보이던 이 명예회장이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경이다. 당시 대림은 계속되는 악재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낸 안양 비산동 사기분양 사건, 뚝섬 주상복합아파트 특혜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졌다. 여기에 부도설까지 터졌다. 부도설은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지만 대림은 주가하락과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명예회장이 회사로 돌아온 것도 ‘이런 사정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란 관측이었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으며 대책을 지시했다고 한다. 부도설이 터지자 재빨리 실적을 발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도 이 명예회장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부 정보 유출과 위기 대처 능력 등에 대해 임원들을 질책하며 군기잡기에도 나섰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명예회장의 일선 복귀가 차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왔다. 이 부사장은 이 명예회장이 물러난 후 주요 사업에 관여했지만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그룹 안팎에선 이 부사장의 후계자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눈길도 점차 늘어났다. 특히 부도설이 터지자 비난의 화살이 이 부사장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대림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당시 “좋지 않은 일이 계속 닥치는데 그룹을 물려받을 이 부사장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뭔가 보여줘야 믿고 따를 것 아니냐”며 이 부사장의 리더십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명예회장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명예회장은 아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도 진두지휘했다. 대림은 계열사인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H&L을 합병했는데 이로 인해 이 부사장은 후계 승계로 가는 탄탄대로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지분 21.67%를 가지고 있는,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기타계열사’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이 명예회장도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89.8%를 보유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다. 당시 양사의 합병은 이 명예회장이 직접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림H&L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이 부사장은 이 합병으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32.1%(이 명예회장은 61%로 감소)를 확보해 단숨에 2대주주로 등극했다. 대림H&L은 그룹 내부의 ‘물량 밀어주기’ 등을 통해 덩치를 불렸던 곳. 이 때문에 몇몇 시민단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기도 했으나 당시 대림 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병했다”며 일축했다.
아버지의 맹활약(?) 덕분에 산적한 부담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이 부사장의 발걸음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최근 이 부사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유화부문은 물론 다른 계열사들의 업무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부문 실적 챙기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규사업 프로젝트를 구상할 팀도 꾸릴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재계 20위(공기업 및 민영화된 공기업 제외)인 그룹 규모에 비해 이 부사장에 대한 홍보가 덜 됐다는 판단을 하고 회사 차원에서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 부사장의 모습은 이 명예회장의 최근 행보와 맞물리며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올해 초부터 부쩍 활동 반경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공식석상을 제외하고는 회사와 관련한 업무에 이 명예회장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림 측은 공식적으로 “명예회장님은 회사에 매일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림의 한 관계자는 “직함으로 보면 부사장에 불과하지만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 부사장의 최종 승인이 나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명예회장이 다시 경영에서 손을 뗀 후 이 부사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서는 이 부사장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 부사장은 여러 사업에 투자를 했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손실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 부사장의 개인회사로 평가받는 대림H&L은 복권사업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 부사장이 투자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부도가 났다.
또한 이 부사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뚝섬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역시 부동산 시장 위축 때문이긴 하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다. 그룹 안팎에서 이 부사장 자질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졌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서의 대림 내부 관계자는 “2세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적은 나이(40세)도 아니지 않느냐. 그룹을 물려받아야 할 이 부사장이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다른 대기업의 후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사장에게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