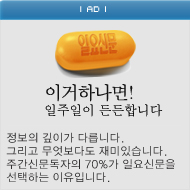
| ||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한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6월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채 중 정부 대행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 이후 청와대가 그 진의 파악에 나섰던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다. 박 전 대표가 4대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중 상당액을 떠맡은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 벌써부터 야권에선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며 반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 일각에선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 전 대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한 친이계 초선 의원은 “4대강까지 실패하면 현 정권에서 남는 게 뭐냐. 개헌은 내주더라도 4대강만은 성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박 전 대표 힘이 절실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청와대 몇몇 비서진들과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들은 친이와 친박이 개헌과 4대강 사업을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소수 의견에 불과하지만 여권 핵심부 역시 ‘빅딜설’에 대해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의 한 고위 관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칠 수 있다. 개헌과 4대강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4대강이다. 박 전 대표에게 ‘온전한 권력’을 주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들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 대통령은 그 어떤 것보다 4대강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권력’인 박 전 대표에게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친박계의 한 중진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우리로서도 (빅딜설은) 그리 손해는 보지 않을 듯하다. 세종시에 이어 4대강까지 기를 쓰고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적당히 양보해주는 대신 헌법을 박 전 대표의 지론에 가깝게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원칙을 중시하는 박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빅딜설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